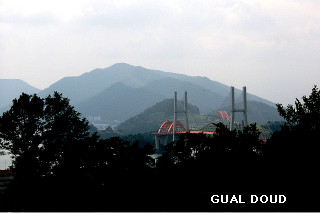|
연대 |
시대구분 |
가락국의 역사 |
관련자료 | |||
|
한국사 |
가야사 |
문헌 |
유적 |
유물 | ||
|
기원전 25∼10세기 |
신석기 시대 단군조선 |
가야 전사 | 최초의 김해인 김해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무 리를 이루어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 조개무지 장유수가리 |
덧띠문토기 빗살무늬토기 뼈낚시바늘 | |
|
기원전 10∼1세기 |
청동기시대 고조선 B.C108년 고조선멸 망,한사 군설치 |
구간사회(九干社會) 김해지역이 가락구촌(駕洛九村)으로 나뉘어 구간이라는 촌장에 의해 영 도되고, 연합하기도 하였던 부족연합 단계의 사회생활을 하였다 | 고인돌 구산동구지봉 장유면무계리 주촌면양동리 대동면감내리 상동면우계리 진영읍본산리 독무덤 회현리조개무지 돌널무덤 회현리조개무지 |
좁은놋단검 대롱옥 구슬옥 간돌검 간돌촉 붉은간토기 민무늬토 기 | ||
|
기원전 2 ∼기원후 1 세 기 |
삼국건국 B.C57년 신라, B.C37년 고구려, B.C18년 백제 37년 고구려 낙랑축출 57년 신라 탈해즉위 85년 점제현신 사비 |
전기가야 | 가락국의 성립 - 小國 42년 수로왕(首露王)이 구지봉에 등 장하여 가락국을 세웠다 43년 수로왕이 신답평에 도읍을 정 하고, 왕궁을 세웠다 44년 수로왕이 왕위를 빼앗으러 온 탈해(脫解)를 계림으로 쫓아냈다 48년 수로왕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 (許黃玉)을 맞아들여 혼인하였다 77년 아찬(阿 ) 길문(吉門)의 신라 군과 황산진(黃山津)에서 싸웠다 94년 신라의 마두성(馬頭城)을 공격 하였다 96년 신라의 남경을 침략하여 가성 주(加城主) 장세(長世)를 살해하였다 97년 신라에게 사죄하였다 |
삼국지 삼국유사 |
널무덤 구지로12호분 내덕리19호분 양동리17호분 양동리427호분 봉황대유적 |
와질토기 철제관(鐵 製冠) 가야식동 검 가야식본 뜬거울 중국식청 동거울 집터 |
| 삼국사기 | ||||||
|
1 ∼ 3세기 |
101년 신라 월 성축조 111년 부여 낙 랑공격 157년 신라 세 오녀도 일 173년 신라 왜 외교 194년 고구려 을파소 진대법 실시 205년 위 대방 군설치 214년 백제 신 라 전쟁 | 전기가야 | 가락국의 성장 - 大國 102년 수로왕은 신라의 요청에 따라 신 라에 가 음즙벌국(안강)과 실직곡국(삼 척)의 영토분쟁을 조정해주고, 신라 육 부(六部)의 하나 한기부(漢祇部) 촌장 보제(保齊)를 죽이고 귀국하였다 106년 신라 마두성주를 시켜 가야를 침 략하였다 115년 2월에 신라의 남경을 공격하고, 7 월에 신라 지마왕의 침입을 황산하(黃山 河)에서 격퇴하였다 116년 신라 정병 1만의 침입을 물리쳤다 189년 허왕후가 157세로 돌아갔다 199년 수로왕이 158세로 돌아가고, 제2 대 거등왕(居登王)이 즉위하였다 201년 가야가 신라에 화친을 요청하였다 209년 포상팔국이 연합하여 가락국을 공 격하자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 하였다. 신라는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 음을 보내 포상팔국군을 격퇴하였다. 212년 골포(骨浦, 마산)·칠포(柒浦, 칠 원)·고사포(古史浦, 고성)의 3국이 신라 의 갈화성(竭火城, 울산)을 공략하였다 3세기 가락국은 고대동아시아의 유일한 중개무역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해상왕국이었다 3세기 가락국은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대 방군과 일본에까지 철을 수출하는 철의 왕국이었다 | 삼 국 지 삼국사기 |
토광목곽묘 대성동27호분 대성동53호분 양동162호분 허왕후릉 수로왕릉 마을유적 봉황대유적 부원동유적 토광목곽묘 대성동45호분 |
철촉 철검 철부 소뿔 잡이단지 유리옥목걸 이 판상철부 철정 철검 오르도스형 철솥 따비 재갈 본뜬거울 구슬옥목걸 이 중국식청동 거울 환호 송풍관 이동식 부뚜 막 점치는뼈 고정식부뚜막 노형토기 철창 철촉 고리큰칼 옥꾸미개 보습 따비 막대모양철부 |
| 삼국사기 삼국유사 | ||||||
| 삼 국 지 | ||||||
|
3세기 |
233년 신라왜에 대승 246년 위 관구검 고 구려 침략 |
전기가야 |
212년 신라에 왕자를 볼모로 보내었다 253년 거등왕이 돌아가고, 제3대 마품 왕(麻品王)이 즉위하였다 291년 마품왕이 돌아가고, 제4대 거질 미왕(居叱彌王)이 즉위하였다 | 삼국사기 | 대성동29호 양동235호 | 금동관편 노형기대 두귀단지 오르도스형 청동솥 고리큰칼 수정목걸이 철정 |
| 삼국유사 | ||||||
|
4∼ 5 세기 |
304년 백제낙랑 공격 307년 신라 국호 사용 313·4년 고구려 낙 랑·대방축 출 346년 백제 근초고왕 즉위 399년 신라 고구려에 구원요청 |
가야사의 전 환 기 |
가락국의 쇠퇴 313·4년 고구려가 낙랑·대방군을 축출하여, 가락국에 들어오던 중국 선 진문물의 수입이 단절되었다 346년 거질미왕이 돌아가고, 제5대 이 시품왕(伊尸品王)이 즉위하였다 400년 고구려광개토왕이 보낸 보병 기병 5만이 임나가라(任那加羅)종발성 (從拔城)에 이르자 항복하고, 안라(安 羅, 함안)가 대항하였다 | 삼국지사 기 | 덧널무덤 대성동13호 대성동10·18호 대성동1·2·3·23호 구덩식돌방무덤 대성동42호 대성동Ⅱ16호 예안리고분군 |
노형기대 바람개비모 양청동기 몽고발모양 투구 비늘갑옷 통모양청동기 굽다리접시 사발모양기대 철기류 편두 (두개골 성형) |
|
유사 | ||||||
| 광개 토 왕 릉 비 | ||||||
|
5C |
414년 광개토왕비 건립 424년 고구 려 신라 외 교 449년 중원 고구려비 475년 백제 개로왕패사 웅진천도 493년 신라 백제 결혼 동맹 494년 부여 고구려에 투항 |
후기가야 |
407년 이시품왕이 돌아가고, 제6대 좌지왕(坐知王)이 즉위하였다 421년 좌지왕이 돌아가고, 제7대 취희 왕(吹希王)이 즉위하였다 451년 취희왕이 돌아가고, 제8대 질지 왕이 즉위하였다 452년 질지왕이 허왕후의 명복을 빌 기위해 왕후사(王后寺)를 세웠다 479년 대가야왕이 중국 남제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였다 대가야의 우륵이 가야금12곡을 작곡 하였다 481년 가야·백제·신라연합군 고구 려격퇴 492년 질지왕이 돌아가고, 제9대 겸지 왕(鉗知王)이 즉위하였다 496년 가야가 꼬리가 다섯 자 되는 흰꿩을 신라에 보냈다 | 삼국유사 | 토광목곽묘 대성동1호 대성동7호 명월사 흥국사 부산강서지사동 구덩식돌방무덤 대성Ⅰ3·4호 | 굽다리접시 발형기대 마주 행엽 등자 철정 통형동기 컵형토기 판갑 금동삼존불 대도 은귀걸이 |
|
사 기 | ||||||
| 삼국유사 | ||||||
|
6∼ 7C |
503년 신라 왕호 제정 513년 백제 일본에 오경 박사 파견 520년 신라 율령반포 525년 무녕 왕릉 538년 백제 일본에 불교 전파 551년 단양 적성비 553년 신라 한강유역확 보 554년 백제 신라 관산성 전투 성왕전 사 561년 창녕 진흥왕순수 비 |
후기가야 |
521년 겸지왕이 돌아가고, 제10대 구형왕(仇衡王)이 즉위하였다 522년 대가야왕이 신라에 청혼하였다 가락국의 멸망 524년 신라 법흥왕이 남쪽 의 변경을 순행할 때 가야 왕이 가서 만났다 532년 구해(형)왕이 왕비와 노종(奴宗)·무덕(武德)·무 력(武力)의 세 왕자를 데리 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신라 는 이들을 진골(眞骨)로 편 입시키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해 주었다 551년 대가야 우륵이 신라 에 투항하였다 554년 가라가 관산성전투에 참전하였다 561년 안라국(함안) 멸망 562년 대가야(고령) 멸망 | 삼국사기삼국유사 일본서기 | 굴식돌방무덤 구산동고분군 구산동유적 유하리전왕릉 산청전구형왕릉 |
신라식토기 신라토기 가마 도장무늬토기 금동장식 |
가야사 연표
(『삼국사기』,『삼국유사』,『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관련 기사에 의거)
42년
3월, 금관국 수로왕 즉위하여 가락국(금관국) 건국.(유사)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 (伊珍阿?王·
일명 惱窒朱日)이 즉위하여 대가야국 건국.(승람)
43년
금관국 수로왕, 신답평(新畓平)에 도읍을 정함.(유사)
44년
금관국, 궁궐과 관사를 낙성함. 수로왕, 신궁으로 옮겨 정무를 봄. 탈해(탈해)가 나타나 왕위를 쟁탈하려 하자 수로가 싸워 계림(鷄林)으로 쫓아냄.(유사)
48년
아유타국(阿鍮陀國) 공주 허황옥(許黃玉)이 금관국에 오자 수로왕이 그녀와 혼인함.(유 사) 금관국, 9간(干)의 명칭을 고침.(유사)
77년
가야, 신라의 아찬(阿?) 길문(吉門)의 공격을 받아 황산진(黃山津) 어구에서 싸웠으나 1천여명이 사로잡힘.(사기)
87년
7월, 신라 파사왕(婆娑王)이 백제와 가야의 침공에 대비하여 가소(加召), 마두(馬頭)의 두 성을 쌓음.(사기)
94년
2월, 가야, 신라의 마두성을 에워쌌으나 아찬 길원(吉元)의 공격을 받아 물러남.(사기)
96년
9월, 가야, 신라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여 가성주(加城主), 장세(長世)를 죽였으나 신라 파사왕이 보낸 5천 병력과 싸워 패배함.(사기)
97년
정월, 가야, 신라 파사왕이 군사를 일으켜 치려 하자, 사신을 보내어 사죄함.(사기)
102년
8월, 금관국 수로왕, 음즙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이 영역 싸움을 하자 신라의 요청을 받아 해결에 참여하여 문제된 땅을 음즙벌국의 것으로 판정함. 이때 신라 파사왕이 수로왕을 대접. 5부에서는 이찬(伊?)을 파견하였으나 오직 한기부(漢 祇部)만 직위가 낮은 자를 보내자 화가 난 수로왕이 한기부주(漢祇部主) 보제(保齊) 를 죽이고 귀국함.(사기)
106년
8월, 신라 파사왕이 마두성주에게 명하여 가야를 정벌하게 함.(사기)
115년
2월, 가야, 신라의 남쪽 변경을 공격함.(사기) 7월, 가야, 신라 지마왕(祗摩王)이 친히 병력을 거느리고 황산하(黃山河)를 건너 공격해 오자 그를 물리침.(사기)
116년
8월, 가야, 정병 1만으로 구성된 신라의 공격을 받자 성을 굳게 지킴. 때마침 비가 오 래도록 내려 신라병이 물러남.(사기)
189년
3월, 금관국 허황후, 157세로 사망.(유사)
199년
3월, 금관국 수로왕, 158세로 사망하고 세조(世祖) 거등왕(居登王)이 즉위.(유사)
201년
2월, 가야, 신라에 화친을 요청함.(사기)
209년
7월, 포상팔국(浦上八國)이 공모하여 가라(加羅)를 침범하자 가라는 왕자를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함. 신라 나해왕(奈解王)이 태자 우로(太子 于老)와 이벌찬(伊伐 ?) 이음(利音)을 보내어 가라를 구원하여 8국을 항복시킴.(사기) *유사에는 212년 포상8국이 아라(阿羅)를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12년
골포(骨浦), 칠포(漆浦), 고사포(古史浦)등 3국인이 신라의 갈화성(竭火城)을 침공하였 으나 패퇴함.(사기) *유사에는 215년의 일로 되어 있다. 3월, 가야, 신라에 왕자를 보내어 볼모로 삼게 함.(사기)
253년
금관국 거등왕이 사망하고, 마품왕(麻品王) 즉위.(유사)
291년
금관국 마품왕이 사망하고, 거질미왕(居叱彌王) 즉위.(유사)
346년
금관국 거질미왕이 사망하고, 이시품왕(伊尸品王) 즉위.(유사)
400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보낸 병력이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자 성이 항복. 안라인(安羅人)으로 구성된 수병(수병)은 그에 저항.(광개토대왕릉비)
407년
금관국 이시품왕이 사망하고, 좌지왕(坐知王)이 즉위.(유사)
421년
금관국 좌지왕이 사망하고, 취희왕(吹希王)이 즉위.(유사)
451년
금관국 취희왕이 사망하고, 질지왕(?知王)이 즉위.(유사)
452년
금관국,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왕후사(王后寺)를 세움.(유사)
479년
가락국왕 하지(荷知)가 남제(南齊)에 사신을 파견하여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 王)에 제수됨.(남제서)
481년
3월, 가야,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미질부성(彌秩夫城)등을 침공하자 백제와 연합하 여 신라를 구원함.(사기)
492년
금관국 질지왕이 사망하고 겸지왕(鉗知王)이 즉위.(유사)
496년
2월, 가야, 꼬리가 다섯자 되는 백치(白雉)를 신라에 보냄.(사기)
521년
금관국 겸지와이 사망하고, 구형왕(仇衡王)이 즉위.(유사)
522년
3월, 대가야의 이뇌왕(異腦王)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니 신라에서는 이 찬 비조부(比助夫) 딸을 보냄. 그들 사이에 월광태자(月光太子)가 탄생.(사기, 승람)
524년
9월 가야국왕, 신라 법흥왕이 남쪽 국경으로 순행하여 땅을 넓혀 오자 가서 만남.(사 기)
532년
금관국왕 김구해(金仇亥), 왕비와 노종(奴宗), 무덕(武德), 무력(武力) 등 세 왕자를 데리고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멸망. 신라는 그들을 진골로 편입시키고 본국을 식읍 (食邑)으로 삼게 함.(사기, 유사) *『일본서기(일본서기)』에는 구체적인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채 남가라의 멸망 기사가 여러 곳에 보인다.
551년
3월,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이 낭성(娘城)에 행차하였을 때 국원(國原)에 있던 대가야 출신의 악사 우륵(樂師 于勒)과 그의 제자 이문(이文)을 불러 음악을 연주케 함.(사 기)*『일본서기』에는 이 해에 백제의 주도 아래 신라와 임나가 한강 유역에 진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552년
신라의 진흥왕이 계고(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 등 3인으로 하여금 우륵에게 음 악을 배우게 함.(사기)
554년
가량(加良), 백제와 함께 신라의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하다가 대패 당함.(사기) *『일본서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자세한 기사가 실려 있다.
562년
가야가 반란하므로, 이사부(異斯夫)가 거느린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함. 그곳에 대가야군(大加耶郡)이 두어짐.(사기)*『일본서기』에는 같은 해 6월에 임나10국이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음.
출전 :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http://todori.inje.ac.kr/~kaya/main.htm